
중국 광동성약품감독관리국(GDDA)의 한국산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FDA가 2017년 하반기에 수십여 개의 K-뷰티 제조업체에 대해 방문 실사를 시작한 것처럼,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중국 NMPA 대행기관인 매리스그룹(Maris)의 김선화 대리는 “최근 GDDA는 ‘화장품감독검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적발된 15개사에서 재료 및 제품문제, 품질관리, 생산관리 문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며 ”향후 한국산 제조업체를 방문, 중국 화장품안전조례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우리나라의 화장품법과 같다. 1989년에 제정 후 올해 3월 ‘감독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반영한 성급 첫 ‘광동성화장품안전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 화장품 안전감독 관련 최초의 현지 규정이다. 무려 30년 만의 개정이다. 이로써 작년부터 이어진 중국 화장품제도의 정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광동성에는 약 2600여개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분포하며 이는 중국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광동성은 중국

한국콜마가 2분기 실적 악화에다 오너리스크, 채무액의 증가 등 3중고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일제히 한국콜마의 목표주가를 대거 하향 조정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콜마는 14일 52주 신저가를 잇달아 기록했다. 17일 한국콜마는 중국의 베이징법인과 우시법인에 3건, 217억원을 채무보증 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두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총액은 1860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한국콜마의 상반기까지의 총 차입금은 1조 1939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보다 869억원 증가했다. 작년 한국콜마의 부채비율은 170%에 달한다. 한편 한국콜마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한 4098억원, 영업이익은 54.5% 증가한 380억원을 기록했다. CKM의 CJ헬스케어 인수효과가 이어지며 실적이 성장했다. 그러나 주력사업인 화장품은 매출액 2395억원(-2.6%), 영업이익 215억원(-4.8%)로 저조했다. 국내는 화장품 시장 부진과 중국 수출(-42.6%) 물량 감소 때문이다. 특히 중국 법인의 부진으로 타격이 컸다. 상반기 중국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베이징법인 314억원, 우시법인은 75억원이다. 반기순순익은 베이징 4억원, 우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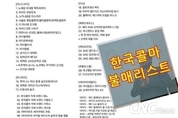
’제조원 표기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국콜마가 윤동한 회장의 오너리스크에 몰리면서, ’제조원 표기‘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즉 네티즌 사이에 퍼지는 한국콜마 불매 리스트 때문이다. 최근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의 방침으로 굳어진 ’제조원 표기 선택제‘는 화장품법 개정이라는 절차만 남은 상태. 하지만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에서 ’제조원 표기‘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한국콜마가 정작 ’제조원 표기‘로 곤경에 처하는 패러독스에 시달리고 있다.(20개 사 참석 찬성 14개사, 조건부 찬성 4개사, 반대 2개사, 참조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825) 윤동한 회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일선 사퇴‘를 선언하며, ’막말 영상 시청‘ 파문의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NO JAPAN‘ 불매기업 중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콜마 생산 제품의 불매 리스트가 돌면서, 해당 브랜드사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콜마가 생산하는 제품 리스트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투쿨포스쿨, AHC 등 유수의 기업이 포함된 제품 100여 개 내외가 올라와 있다. 한국콜마가 밝힌 화장품의 거래처는 국내외 3

한국콜마는 자회사인 콜마스크가 29일 제이준코스메틱 인천공장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공장규모는 대지 6,612㎡(2,000평), 연면적 1만4,231㎡(4,305평)로 연간 2억5천만 장의 마스크 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수가는 320억원이다. 이번 인수로 콜마스크의 생산량은 연간 4억장으로 늘어난다. 계약 내용에는 기존 제이준코스메틱의 제조 물량을 위탁 생산하는 조항이 있어, 안정적 매출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이준차이나를 통한 중국 유통라인 활용도 가능해 중국 신규 고객사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로써 지피클럽 물량 축소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콜마스크는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및 북미지역 진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콜마스크는 5년 내 글로벌 마스크팩 제조전문 1위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설립한 콜마스크는 설립 1년만에 7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콜마홀딩스는 대한제당의 바이오의약품 계열사인 티케이엠(TKM Co.,Ltd.)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7%를 확보하고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했다. 티케이엠은 2002년 대한제당의 바이오 사업부문

화장품 포장재로 사용 가능하면서,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그렇다면 그 외의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 2(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제9조의 4(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제9조의 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에 따라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는 사용하면 안된다. 즉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 없는 포장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의무화→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 ▲1년 이내에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 충족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 명령 ▲중단 명령에도 불가피한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로는 대표적인 게 ①PVC ②유색PET병 ③PET병 라벨 접착 관련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일반접착제(먹는 샘물 및 음료병에 한함) 등이다. 일단 PVC(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는 사용이 금지된다. PVC는 프탈산계(DEHP, DINP, DBP 등) 가소제나 아디핀산계(DHEA 등) 가소제를 사용한다. EU산하 ’독성·생태독성·환경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PVC

자원재활용법 상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이들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단계로 구분하고,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산단계부터 9개 포장재 각각의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도록 평가 기준이 마련됐고, 그것이 지난 4월 17일 고시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이다. 현행 국내 재활용 여건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은 △재활용 용이성 △분리 배출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함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⑥풀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종이팩: 재활용품 색상에 영향을 주는 유색펄프 사용 → 어려움 ▲유리병: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착식 합성수지 라벨 → 우수 와인병과 같은 짙은 색상 병, 접착제 사용 라벨 → 어려움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아이스박스 등),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등) → 별도 등급기준 마련 ▲페트병은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몸체 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는 12월 25일 이후부터 포장재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업종에서는 생산자인 책임판매업자가 평가등급별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해 내게 된다. 예를 들어 페트병 포장재의 등급기준은 ▲몸체: ‘단일재질 무색’ ▲라벨: 절취선 등 소비자가 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마개 및 잡자재: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사용 등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반면 세부기준에서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열알칼리성 분리 불가능한 접착제 사용, PVC 재질의 마개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재활용 용이(1등급)→ 최우수, 우수/재활용 보통→보통/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어려움 등 4단계의 등급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 제품의 포장재는 기존제품 특례(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7월 중 신규제정)에 따라 오른쪽과 같은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품 특례는 ‘19. 12. 25 이전부터 생산되고 있던

째깍 째깍 …. 무려 40만여 종을 생산하는 화장품업계의 ‘포장대란’을 재촉하는 소리다. 하지만 업계 관심은 미약하다. 작년 연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 금지로 화장품의 코팅 쇼핑백이 사라지면서, 조금 실감하는 정도다. 하지만 오는 12월 25일이면 환경부가 개정한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다.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및 평가된 등급표시 의무화(분리배출표시와 병기)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적용된다. 현행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제도 상 생산자는 공제조합(유통센터)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선별업체(분리수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화장품의 경우 생산자는 책임판매업자. 때문에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 실시와 더불어 등급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해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등급평가 및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