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포지셔닝의 첫 번째 덕목. 마케터라면 ‘최초’라는 단어가 소비자의 마인드 속에 가장 쉽게 진입하는 방법임을 본능적으로 안다. 화장품 용기의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가 업계 초미의 과제로 부상했다. 게다가 당장 라벨에 등급제 실시에 따른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브랜드사로서는 필수 선택이 됐다. 이 가운데 감성글로벌㈜(대표 이종현)이 PCR-Pet 100%를 사용한 '닥터올가 다시마 탈모증상완화 샴푸', ‘닥터올가 호호바트리 샴푸’ 등 2종을 출시, 주목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솔선수범하려는 닥터올가 브랜드의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이종현 대표는 “바이오 기반 성분 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용기 재활용이 어렵다는 걸 안다. 100%여야 소비자와의 소통에도 원칙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닥터올가’의 제품은 친환경 용기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최초’로 각인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최초’도 ‘브랜드에 내재화’가 되어야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 ‘고객 운명주의’를 사시로 내건 감성글로벌㈜ 이종현 대표가 패키징에서 필(必)환경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25년여 온라인 마케팅에

요즘 화장품장이 사이에서 “수시로 들여다 보는 마케팅서”로 신윤창 작가의 ‘지금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다’(Back to Basics) 구독 붐이 일고 있다. 사인 요청 글이 페북, 카톡에서 인증샷이 틈틈이 올라온다. 왜 그런지는 ‘마케터 신윤창’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한몫했다. 그는 금성사(LG전자)를 시작으로 애경산업, 세라젬H&B, 종근당 등 10여 곳에서 줄곧 마케터였다. 많은 이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에겐 그닥 눈길이 가지 않겠지만, 그가 화장품장이 사이에 ‘명작’으로 꼽히는 ‘인식의 싸움’ 출간에서 밝힌 속내를 보면 그를 다시 보게 된다. 신윤창 작가는 “마케팅 목적은 이익 창출인데 회사는 타깃인 소비자보다 제품 중심 전략을 짜더라. 기업은 제품·기술·기업 내부 환경 위주로 마케팅을 하면서도 이를 깨우치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과 리더의 독선, 군대식 문화 등이 갈등 요인이 됐다”고 설명한다. 그가 ‘회사·직장 상사와 자신 사이의 인식 싸움’을 그치지 않는 이유는 그 지점이 ‘고객 마인드를 점유하기 위한 포지셔닝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좋은 제품 만들기, 광고, 판촉은 전술이라 부른다. 마케팅은 전략이라 부르는 데서 전사

비즈니스에서는 항상 ‘문제의 발견’과 ‘문제의 해결’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부를 생성한다. 현재 화장품 업계의 문제는 병목현상(bottleneck), 곧 브랜드사는 마케팅 및 판로, 제조사는 MOQ에서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위기 후에 K-뷰티가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나가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구상’과 ‘돌파’가 가능한 유연한 사고를 가진 재야 고수(在野高手)가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김승중 부회장이다. 그를 잘 아는 한 업계 대표는 “김승중 부회장은 화장품에 대한 애정이 깊다. 분야마다 두루 알고 업계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논 상대자”라고 말한다. 그가 속한 단체 톡방이나 페이스북에는 “애로사항도 곧잘 상담하고 대신 알아봐 주는 고마운 선배, 선생님”으로 통한다. 사업하는 이들에게 해답을 찾는 통로이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깨달음을 준다는 게다. 또한 해외 저널을 섭렵하며 참고자료를 기꺼이 내주는 부지런함과 세세한 설명은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라는 댓글 릴레이로 이어진다. #1 선생 선생(先生)이란 단어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을 뜻한다. 더 확장하면 먼저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다. 경험이 없으면 선생이 아니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의 제2 전략이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K-뷰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춘 업계의 당면 과제가 기업별 스케일업(Scale-Up)이다. 스케일업이란 규모(scale)을 확대(up)하는 것을 뜻한다. 스타트업이 ①주력 제품과 ②상당한 규모의 확실한 시장 ③견고한 유통채널을 갖출 정도로 성장하면 스케일업(scale up)이 된다. 스케일업은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중요하다.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김승중 부회장은 ”2만여 업체가 경쟁하는 심화 단계에서는 N개의 상품이 있는 시장에 하나 더 내놓은 N+1식의 전략은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질타한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화장품업계가 독창적인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멀티 마켓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4가지 Up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Start Up(민첩하게 대표상품을 발굴)→Scale Up(규모를 키워 브랜드로 육성)→Skill Up(인재를 키워 핵심역량을 보유)→System Up(시스템을 통한 지속성장)이다. #1 "디테일에 강해야 살아남는다" "스타트업은 여러 상품이 아

서기 207년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면서 생긴 사자성어가 삼고초려(三顧草廬)다. 당시 유비는 실질적인 중원의 지배자 조조, 강동의 손권에 비해 땅도 책사도 없는 거의 무일푼 한 황실 후예일 뿐이었다. 이에 제갈량은 유비에게 “북쪽의 조조는 천시(天時)를 누리게 놓아두고, 남쪽은 손권이 땅의 지리(地利)를 차지하게 버려두고, 인화(人和)로 서쪽에서 솥발(鼎)이 셋으로 떠받들 듯 천하의 셋 중 하나를 차지하라”고 제안한다. #1 AD시대 브랜드 생존 전략 2가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유통환경은 삼국지 형세, 즉 ▲조조=1100개의 온라인쇼핑몰(통계청 조사대상) ▲손권=옴니채널(온+오프 리테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비=브랜드의 생존싸움이 될 공산이 커졌다. 브랜드는 인적+자본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나름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플랫폼과 리테일 공룡 사이에서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한없이 위축된 브랜드의 담대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미래는 모르지만 누가 리딩(leading)하고 팔로우(follow) 할지는 알 수 있다. 2021 H&B숍의 전망은 소비자의 선택과 유통 공룡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국내 유일의 뷰티전문 마케팅&

42년 전 1인당 GDP 154달러(‘78)에서 1만261달러(’19)의 G2로 부상한 ‘중국 굴기’의 가파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 바로 중국 특색(特色)의 사회주의체제다. 학자들은 “‘중국특색’이란 중국이 원하는 모든 것, 마치 전가의 보도”라고 해석한다. #1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중국 화장품시장 지난 6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화장품굴기’를 위한 중국 특색의 다른 표현이다. 이에 대해 CAIQTEST Korea(检科测试) 최석환 대표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K-뷰티의 중국 수입화장품시장 1위 복귀에 중요한 키(key)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이 원하는 특색, 즉 제1조의 ‘화장품 품질 안전 보증’에 맞춘 K-뷰티의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14개 시행세칙 준수를 통해 품질관리와 안전성 이슈에서 중국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안전한 K-뷰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K-뷰티는 중국 수입화장품시장에서 일본·프랑스에 이어 3위. ’18년 1위에서 내려온 이후 두 나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증가율로 성장동력이 크게 추락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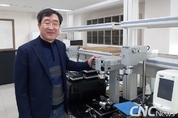
최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합격률로 응시자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6일 제2회 시험 때의 합격률은 10.1%로 1회의 33.1%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8월에 치른 특별(추가)시험의 합격률은 9.9%였다. 국민청원에는 10만원의 응시료가 고가라며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1 다양한 계층이 응시, '어렵다' 90% 이에 대해 성신여대 뷰티대학원 김주덕 교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화장품에 관심이 높은 다양한 계층이 시험을 본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사, 약사, 피부관리사, DIY 업종 종사자들이 응시하는데 난이도에 불만이 높다. 1, 2회 시험 문제는 내가 봐도 어렵게 나왔다”고 말했다. 시험의 난이도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 취지와 부딪친다. 김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고급의 전문인력을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게 식약처의 방침이라면, 차라리 NCS와 같은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응시자들을 조사한 논문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의 시행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효원,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화장품학 전공)다. 1회 논문 응시자 중 응답자 408명을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화장품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선 중국이 K-뷰티의 활로임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 화장품시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생태계가 한층 복잡해졌다. 또한 5세대 이커머스로 진화한 ‘라이브 커머스’ 등장으로 채널별 맞춤형 마케팅이 필수가 됐다. 때문에 K-뷰티로서는 중국시장 진출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티몰에 안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래서 씨앤씨뉴스가 찾아간 곳이 K-뷰티 해외직구 티몰글로벌 전문점을 운영하는 대한퐁퐁탕뷰티전영점(天猫国际大韩泡泡糖美妆海外专营店)이다. DMI Company 한재진 대표 및 이승훈 부서장을 만나 K-뷰티의 중국 온라인 뷰티시장 진출 전략을 들었다. Q1 중국 온라인시장의 특징을 말해달라 한재진 대표: 티몰(天猫), 징둥닷컴, VIP.com 등의 플랫폼, 샤홍수, 위챗 등의 소셜커머스가 경쟁 중이다. 기업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대신 플랫폼의 사용자 분석과 브랜드 포지셔닝에 맞는 채널 선택이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타오바오는 C2C로 국내숍이어서 해외 브랜드가 진출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외직구가 불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