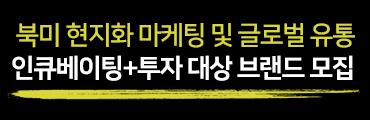사모펀드가 잇달아 화장품 기업 인수를 추진하면서,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코스닥 상장 가능한 매출만 올리면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사모펀드에 인수되고 ‘뻥튀기’ 예정 매물로 등록되면서 화장품산업의 성장력을 오히려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사모펀드(PEF)운용사 더함파트너스가 890억원에 티르티르 경영권 인수를 완료했다. 티르티르는 2019년 창업했으며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기업가치가 높아졌다. 매출액은 412억원(‘20) → 465억원(’21)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영업이익은 56억원이다.
병원용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해온 더마펌은 최대주주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PE)가 보유한 지분 70%와 창업자 보유 지분 포함 100%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또 IMM프라이빗에쿼티는 에이블씨앤씨 매각을 위한 본 입찰을 진행 중이다. 2017년 미샤를 4200억원에 인수했으나 실적 부진에 몸값을 낮춰 매물로 나왔다. 국내외 6곳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가 ODM사인 솔레오코스메틱 경영권을 400억원 내외로 인수했다. 2020년에는 스킨푸드가 파인트리파트너스에 2천억원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마쳤다. 참존화장품도 사모펀드가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했으나 미국 암웨스트펀딩과 대부업체에 매각됐다. 퀸테사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지디케이화장품은 800억원을 투자했다.
물론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인수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기업 가치를 높여 다시 파는 것이다. 필요한 자금 투자와 유능한 경영진 참여로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물론 옥석을 가리겠지만 사모펀드 인수 후 예측대로 성과를 올린 기업이 드물다는 점은 아쉽다. 그만큼 사모펀드의 화장품기업 인수는 만만치 않다. 전문성과 시장 트렌드 대응, 인재 양성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프라이즈 실적에 힘입어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현실에선 그렇다. 막상 투자받은 기업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리하기 보단 기업 체질을 강화하면서 역량에 맞는 수준에서 성장하는 게 낫다는 기업도 있다.
투자업계에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빅2 ODM만으로 한계에 이른 화장품 업종에 새로운 동력원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혁신 제품과 아이디어로 성장한 기업의 사모펀드 인수는 박수칠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갬블’화함으로써 산업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실력과 상관없이 과도한 투자를 받아 무리한 퍼포먼스 마케팅과 실적 뻥튀기로 너도나도 코스닥 상장만 노리는 조급증은 화장품산업 발전의 독소로 작용한다. 화장품산업에서 보면 기업가 정신 실종, 산업 발전 기여 저해, 피인수 기업 임직원의 이직·실직으로 인한 인재 상실 등 부작용이 제기된다.
특히 인수 과정에서 오너만 거액을 챙기고 성장에 일조한 임직원들은 아무런 과실 없이 새 주인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갑작스런 이직과 퇴사로 기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이는 업계 전체에 ‘한탕주의’로 감염된다. 재직 중인 직원들이 회사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순간 사표를 던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실례로 아마존 히트 상품을 낸 기업은 갑작스런 담당자의 사직으로 곤란을 겪곤 한다.
일본 화장품업계는 10년 후, 30년 후의 업계 변화와 그 변화 속 지속성장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즉 ▲ 신규 수요를 공략하는 비즈니스 전략 ▲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일본 브랜드 확립 ▲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 ▲ 다양한 인재 활용 ▲ SDGs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 등을 대처 방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화장품산업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 화장품산업은 중국 특수로 시드머니를 잔뜩 벌어놓고선 불과 수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고 중국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일회성 깜짝 실적으로 상장한 코스닥에서 정크 수준 주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기업은 없다. 더욱이 사모펀드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