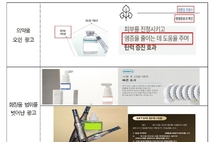
또 화장품의 부당광고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식약처의 부당·허위·과대 광고 적발은 ➊ 모발 66건(6.21) ➋ 라방 10건(6.17) ➌ 피부과 추천 373건(5.24) ➍ 숏폼 73건(4.21) ➎ 화장품 둔갑 허위 144건(3.16)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현행법 상 모든 책임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게 귀속되는 관계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식약처는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 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

올해 상반기 대형 유통업체(오프 13, 온 10)의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출은 0.1% 감소하고 온라인은 15.8%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출의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 시기 ‘20년 상반기 이후 5년만이다. 이는 처음으로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을 넘어섰음을 뜻한다. ‘25년 상반기 오프라인 vs 온라인 매출 비중은 46.4% vs 53.6%였다. ’24년 상반기 오프(50.1%) vs 온(49.9%)에서 역전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화장품에서도 드러난다. 화장품 소매액은 △ 1/4분기 3조4440억원(-5.8%) △ 2/4분기 3조4478억원(-2.7%)으로 감소했으나 온라인 매출은 △ 1/4분기 +8.3% △ 2/4분기 +7.6%로 성장했다. 6월 화장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41%로 역대 최고치다. 다만 올리브영, 다이소 등 옴니채널 운영으로 온라인이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은 대형 유통업체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발표된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은 1조 1475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금액으로 1108억원 증가했다. 이중 모바일 비중은 77.7%였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이 라이브커머스 누적 방송 5000회를 기록하고 판매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수익원 가능성 및 타깃층 모객과 함께 상시 유통채널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모레퍼시픽의 라이브커머스는 2020년 4월 헤라(HERA) 라이브 방송이 첫 스타트다. 본사 내 라이브 전담 조직과 전용 스튜디오를 신설하며 역량 확보에 힘써왔다.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장비와 기술을 습득하고, 라이브 전 과정을 외부 의존 없이 자체 소화 가능한 구조로 구축했다. 2023년에는 아모레몰에 라이브 쇼핑 전용 공간 '라이브 탭'을 신설하고 실시간 방송과 지난 방송 보기, 방송 편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했다. 대폭 확대된 편의성을 발판 삼아 라이브 탭 오픈 첫 해 시청자 수는 약 300% 늘어났다. 이후 매년 100% 이상 성장하며 올해는 아모레몰 라이브 방송으로만 100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마친 아모레몰 ‘2025 서머 아모레 세일 페스타’에서는 릴레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3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고객 중심의 콘텐츠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네이버, 카카오, GS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