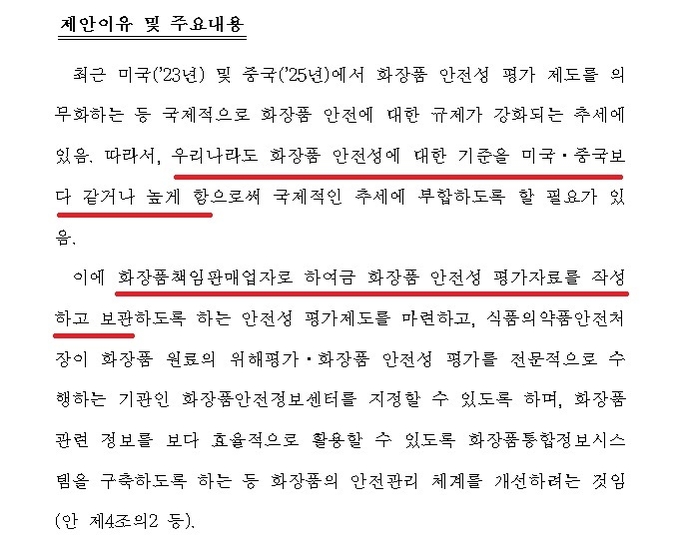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전면 도입에 맞춰 책임판매업자에게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화장품법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업계는 기존 규제에 ‘안전성 평가’라는 새로운 규제를 더해 ‘규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ㆍ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➊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보관 ➋ 식약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➌ 화장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각 조문을 살펴보면 ①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제품별로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 ② 자료 작성은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 ③ 식약처장의 제출 요구 ④ 책임판매업자 준수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 ⑤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지정 등을 명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7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법안 발의는 6월 30일, 협회 공지는 7월 4일, 그리고 오늘(8일)까지 불과 4일 만에 3만여 책임판매업체는 깜깜이 상태로 의견 제출은커녕 고스란히 책임과 규제 비용을 떠안게 됐다.
식약처가 두 차례 정책설명회 및 지역설명회에서 밝힌 안전성 평가 플랫폼 신설에 대해서는 ▲ 화장품 안전성 정보센터 지정 ▲ 화장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 본격 도입을 알리는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즉 업계가 희망하고 있는 △ 제조업자 표기 삭제 △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 △ 표시·광고 규제 개선 △ 광고실증제 완화 등의 호소는 외면하고 ‘안전성’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독박’으로 받게 됐다는 분위기다.
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 인증대행사 간 갈등, 외부 위탁 시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 소요 등의 과제만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둘러싸고 책임판매업자, 제조업자, 인증대행사, 임상시험자 등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판매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반응이다.
수많은 중소, 중견 책임판매업자가 글로벌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즈음에,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시행하고 도움 하나 주지 않던 식약처는 매달 ‘K-뷰티 수출 역대 실적’으로 보도자료를 돌리며 공치사를 하고 있다.
이제 화장품법안 발의는 됐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만의 법 개정 추진을 보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책임판매업자가 ‘봉’은 맞지만,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중소기업이 오직 시장 개척만으로 수출 3위까지 올라온 사정을 조금이라도 봐준다면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기자만의 자괴감으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다.